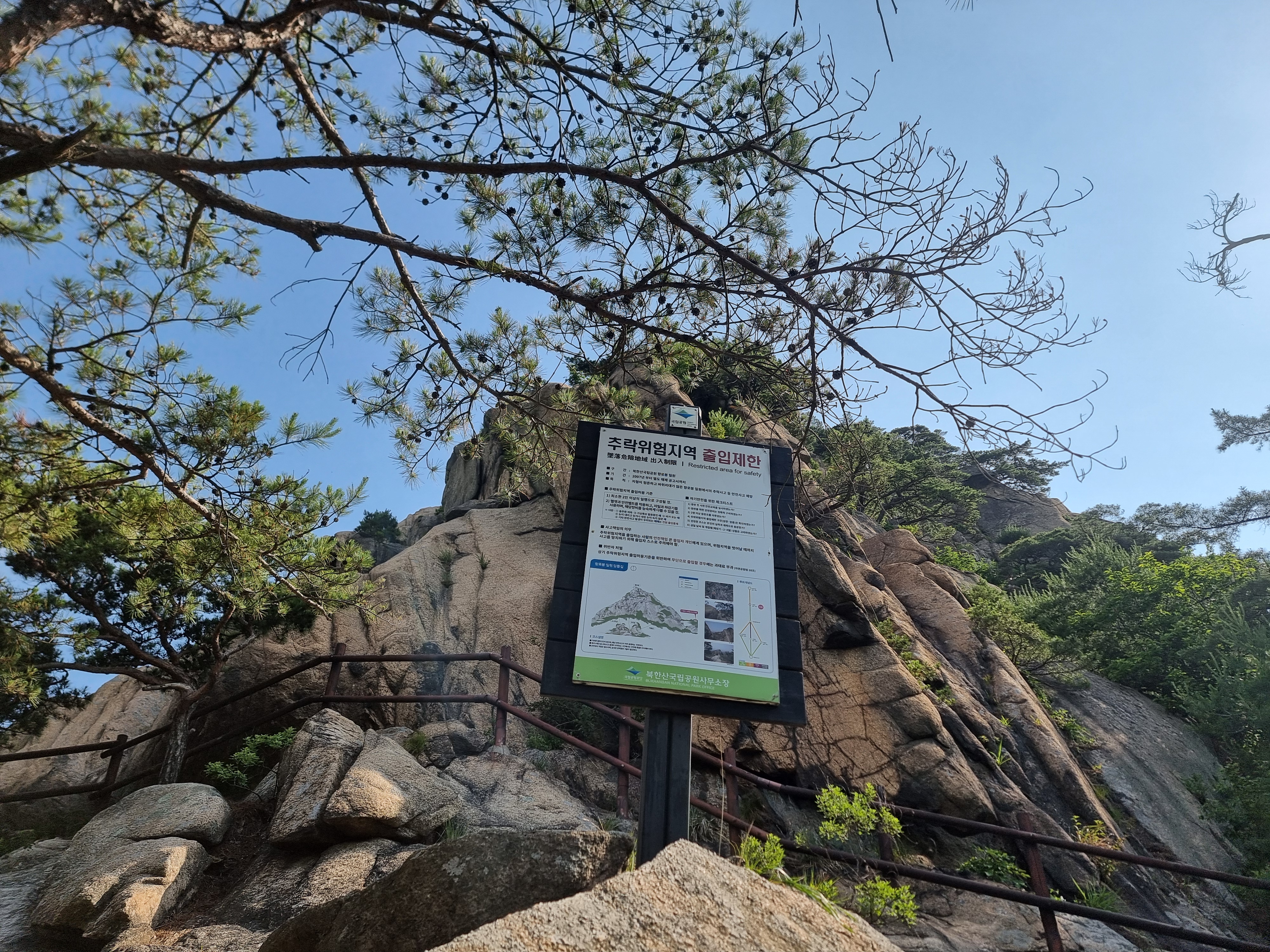*** 순천 조계산 산행 ***
-.일자 ; 2024년 10월 1일
-.코스 : 선암사주차장-선암사-장군봉-연산봉-보리밥집-작은굴목재-선암사주차장(13.7km / 5시간 24분)
한낮에 푹푹 찌는 더위와 조석의 싱그러운 가을 바람으로 아직까지도 여름이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공존의 계절이다.
연일 티끌 하나가 없이 청명한 하늘에 나의 마음도 세탁이 되어 기분은 마냥 상쾌 하기만 한데 가을이가 슬며시 산행이란 강박증을 데려다 놓았다는 건 눈치 채지 못했다.
더위의 기록 갱신과 폭우로 올라 버린 배추 값이야 수입을 해서라도 가격대를 낮추면 되겠지만 한번 늘려나 버린 몸무게로 인해 제대로 된 사람의 형태를 유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움직임뿐이다.
10월이 시작되자 새벽에는 창문을 닫아야만 하는 시원한 바람에 더위는 나 몰라라 내빼 버려서 산행에 대한 핑계거리가 사라졌고 나태함 과의 결별을 선언하기엔 적기다 싶어 조계산을 찾는다.
나 홀로 지방도를 달려서 선암사주차장에 들어 선다.
갑작스런 공휴일 지정으로 혼란도 있지만 이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지 주차장은 만차이고 햇살은 따갑다.
이상한 군상이 별별 요상한 짓들로 세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게 우습지만 어쨌든 나는 휴일로 공돈을 챙겼고 누구 덕분에 입장료 없이 선암사의 들머리로 들어 선다.
푸른 숲이 햇살을 은은한 간접 조명으로 바꾸어 놓았고 물소리만이 청량한 산사의 진입로는 언제나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 준다.

승선교를 지나 태고종 총본산인 조계사로 들어 간다.

매스컴의 2024년 세계유산축전 홍보에 혹시나 했는데 49기 합동득도 수계산림에 예비 스님들의 불경 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어 인간사 어딜 가나 경쟁과 시험의 연속이다.


무거워진 나의 몸과 올라야만 한다는 의지와의 사투에 열불이 난다.
조금만 참자, 저 위 벤치에 가면 몸을 쉬어 줄께 달래면서 겨우 겨우 발걸음을 때고 있다.
어제의 숙취 때문이라 핑계를 대보려고 해도 몸의 게김성이 하도 괴씸 하여 그냥 내쳐 올라 버리기로 마음을 다잡는다.
몸이 가벼워야만 머리도 명석해지고 몸의 순발력도 생기지만 둔탁함은 우직성이 있어 날파리의 방해 공작도 육탄으로 돌파해 버리고 몇 사람을 추월까지 하는 성과를 보여 준다.
흔들리는 나뭇잎에 바람이 걸렸고 무한한 숲의 생명력 속에서 몸도 활력을 찾아 가고 있다.
이제야 길을 안내하는 눈도 거저 먹고 있다는 발걸음의 원망에서 벗어나 평온함이 깃들고 서로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 향로암터에서 약수로 목을 축여 너불어진 돌무더기에 앉아 쉼을 하는데 산밑에서 올라 온 그 넘의 형님 형님 이란 추임새가 상념을 깬다.


샘터가 있다는 것은 그 만큼의 고도가 남아 있다는 증표이고 겨울이면 이곳에서부터 상고대를 피우기 시작하는 급경사의 시작이다.
토사가 빗물에 휩쓸려 버리고 돌만이 들어나 너덜지대와도 같은 오름길에 설치 되었던 계단의 침목들도 나뒹굴어 그 구실을 잃어서 몸은 지구 밖의 행성을 걷고 있는 듯 부자연 스럽다.
뒤로 자꾸만 밀리는 몸을 올라야만이 산다는 의식이 이끌어 정상에 올려 놓는다.
젊은 처자들의 경쾌한 대화에서 나는 세월을 느낀다.
민망스러워서 못할 포즈를 취해가며 자신을 표현하는 자유 분망함이 전 세계에 한류열풍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겠지만 너무 획일화된 느낌도 지울 수 없어 살그머니 비켜나 산 풍경을 본다.

올라 올 땐 티없이 파란 가을 하늘이 비 예보를 증면할 셈인지 연산봉 너머로 구름이 피어 있고 등급을 가릴 수 없는 무등산은 아예 지워 놓았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시원한 산정이고 산비탈은 요즘 아침 저녁의 일교차로 곧 단풍으로 물들일 것만 같이 색이 바래어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이 가을은 감성을 말랑하게 만들었고 힘에 겨워 곧장 보리밥집으로 내려가고자 한 애초의 마음이 변덕이 죽 끓듯 하여 연산봉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한여름처럼 땀에 옷이 젖고 비를 맞은 듯이 흘려 내리질 않아 산행하기에는 적기이니 마음을 따를 수 밖에는 없다.
꽃 향기는 없지만 숲의 상쾌함이 퍼져 있는 산길이 기분을 좋게 한다.
산죽은 정원수를 관리하듯 말끔하게 정리를 하여 놓았고 계단은 빗질을 한 듯하여 발 디딤이 좋아 도심지의 산책길과 다름이 없다.
이 산하가 다 내 것이 되었고 나 혼자 만의 호사다.
나뭇가지 끝에 잎새가 말라가고는 있지만 나무들은 가지런하게 하늘로 치솟아서 그늘을 만들어 놓았고 등로는 스펀지처럼 푹신한 흙길이라 쉼 없이 걷고 있는데도 무리가 없다.


연산봉에 올라 조계산을 조망한다.
그새 장군봉은 구름 속에 자취를 감췄고 긴 골짜기의 물줄기를 승주호가 머금고 있다.

사색이 무념이 되어야 될 터인데 자꾸만 밀려 드는 상념들 때문에 무차별로 달려 드는 날파리를 떨쳐내 듯 연산봉을 떨쳐내고 송광굴목재에 내려 선다.
그러고 보면 입장료가 없어진 후 접치재를 기피하게 되어 송광사를 자연 회피할 수 밖에 없었는데 다음엔 꼭 연계하기로 맘 먹고는 밥 먹으로 보리밥집으로 내려 간다.
연신 밥솥에 뿜어져 나오는 듯한 구름이 계곡을 덮었고 습한 비 기운에는 밥 냄새가 묻어 나는 듯 하여 흘리듯이 보리밥집에 스며 든다.
늦은 시간임에도 손님들로 북적여 겨우 한 켠에 자릴 잡는데 활달한 목소리에 산우가 잡힌다.
참 영원이 자유로운 후배는 처렁처렁한 목소리로 옛 추억들을 영웅담으로 만들어 소개 시켜 주는데 내가 민망스러워 말문이 막힌다.
부인을 동행했으면서도 고추며 숭늉을 챙겨주는 세심한 챙김에는 더 없는 정이 담겨 있어 몸둘 봐를 모르겠다.
한참이나 이어진 수다는 스스럼없는 야유회 느낌이고 나 홀로 남겨 짐은 빈자리의 허전함 이다.
톡톡 떨어지는 비가 외로움을 부추긴다.


예전에 비해 빈약하기 그지 없는 보리밥도 넣어 놓은 양은 있기에 더부룩해진 배는 못 올라간다고 투쟁에 나섰지만 살려면 몸이 시키는 반대로 움직여야만 하기에 타협점이 없다.
살려고 먹고 또 움직여야만이 산다.
항상 선암굴목재 이 곳이 최대 고비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의 뒷모습을 빠니 보면서도 경쟁 의식도 생기지 않고 앞서 본들 피곤함은 온리 나의 몫이다.

우거진 숲이 우산이 되어 주었지만 몸은 젖어 들어 작은굴목재에 올라섰고 시원한 바람의 마중을 받아 선암사를 향해 내려간다.
그 많았던 사람들이 싹 사라지고 물소리만이 청아한 내림길이다.
동네 뒷산 오르듯 부담이 없었던 이곳도 점점 원정산행지가 되고 있어 일상으로의 복귀가 절실해지고 있다.
딸 결혼식이 있는 시월이 지나면 좀 나아 지려나......
그럼 또 환갑이고 정년퇴직인디
오늘이 시월의 첫날이고 국군의날로써 임시휴무일로 지정되다 보니 선암사 진입로에는 행락객이 많다.
저 평범함 속에 행복이 있음을 그 땐 몰랐다.